- 00[아뜨르릉]4월_인터뷰 (1).jpg [size : 342.9 KB] [다운로드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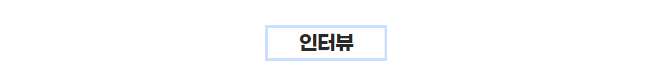
처음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샘물 같은 세 단체와 둘러앉아 팔십 분 동안 떠들었다
인터뷰 : 편집위원회
정리 : 임아영 편집장
샘물 같았다. 이름을 걸고 문화예술교육을 처음 해보는 이들이라서 그랬다. 더불어 젊다. 외롭고 심심한 또래를 만나 글을 쓰고 노래를 짓고 여행을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다국적이다. 세 단체 이름만 보면 그렇다. ‘르 아트 유니크’는 프랑스, ‘부에나 모멘또’는 스페인, ‘이것은 서점이 아니다’는 한국. 올해 ‘예술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이삼십 대와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세 단체를 한 자리에 초대했다. 분명 서로를 모르는데 마치 아는 사이처럼 기획서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그들이 궁금했다. 문화예술교육으로 청년을 만나는 신진 청년 단체라는 두꺼운 줄로 세 개의 큰 구슬을 엮어보고 싶었다.

올해 ‘예술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이삼십 대와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세 단체를 한 자리에 초대했다. ⓒ청춘기획라이브온


(왼쪽부터) '르 아트 유니크' 오주경, 박지훈, '부에나 모멘또' 이정우, '이것은 서점이 아니다' 박수민 ⓒ청춘기획라이브온
문화예술교육은 어떤 순간을 만들어내는 일 아닌가요
이정우 : 얼마 전에 써놓고 달달 외웠다. (모두 웃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예술을 누리기 좋도록 문턱을 낮추는 교육, 창의적 방법으로 개개인이 감성을 끌어내 예술 활동하며 표현해 내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이다.
오주경 : 예술을 하면서 어떤 삶, 누군가의 일상이 달라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표현 욕구와 예술성은 모두에게 있다고 믿는다. 어렵고 특별해야만 예술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다. 아름다운 순간은 항상 늘 일상 속에 있었던 것 같다.
박수민 : 우리는 예술을 전공하지 않았고 작가도 아니고 그냥 서점원이라서 처음엔 문화예술교육을 할 자격이 있는지 고민했다. 그런데 그것이 일상과 예술을 연결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서점에서 늘 하는 게 문화예술교육이더라. 일방으로 가르치지 않고 어떤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말이다. 성공한 농담도 예술, 마음에 드는 책 디자인도 예술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발견하도록 돕는 곳이 문화 서점이라면, 그리고 그게 문화예술교육이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곳은 안전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정우 : “나는 불안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불안이라고 해야 할까. 기획서에 친구 K에 관해 썼다.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K에게 불안하지 않냐고 괜찮게 사는 것 같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제때 월급 받고 여자친구랑 주말에 놀러 다니면서.”라고 하더라.
얼마 전에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청년들이 많이 산다. 한 달 정도, 엘리베이터에 타면 사람들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뚱하거나 조금이라도 부딪히면 싸울 것 같고 암튼 얼굴이 대부분 어두웠다. 불안은 인상에서부터 느낄 수 있더라.
박수민 : 또래들이 취업이나 시험 준비를 할 때 연락을 끊곤 하는데, 다시 만나면 그때 너무 힘들었다면서 상처가 오래가더라.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한 군데를 평생 다니진 않으니까 이직도 생각해야 하고 사람 관계도 힘들어한다. 주거 문제와도 다 연결되어 있다.
나이 들면 무뎌진다는데 정말 그럴까. 누구나 불안하겠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또 바꿀 수 없는 채로 세상이 망해간다고 느끼기 때문에 청년 시기에 정신병이 제일 심한 것 같다. 이야기 중에 나왔듯이 청년이라면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 같지만 사실 다들 지쳐 있고 의욕 없고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서 집 밖엔 나오고 싶은데 재밌고 안전한 모임을 찾을 때 우리 서점에 오길 바란다.
오주경, 박지훈 : 맞다. 우리도 예술을 매개로 안전한 커뮤니티가 되길 바란다. 안전엔 여러 측면이 있을 텐데 ‘르 아트 유니크’에서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별명으로 부르고 안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택했다.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자리 덕분에 누군가를 마음 다해 만나길, 그렇게 문화예술교육은 무엇이라며 자기 정의를 내릴 수 있길 바란다. ⓒ청춘기획라이브온
인터뷰 맞습니까
“올해는 여러 예술가를 만나리라 다짐했는데 오늘 이뤘다”, “같은 뜻으로 일하는 이들을 만나 너무 좋다”, “솔직히 그냥 인터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네 명은 팔십 분만에 의자에서 기분 좋게 일어났다. 시키거나 권하지 않았지만 시커먼 전화기를 고이 쥐고 서로 이름과 연락처, 어쩌면 SNS 계정까지 나누는 것 같았다. 이것은 인터뷰가 아니라 소개팅이었을까. 동그랗게 모여 있는 모습이 어느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똘똘 솟아오르는 샘물과 닮았다. 기꺼이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양새.
시간은 정직하게 흐를 테고 이들은 어떻게든 자신과 닮은 사람들을 만나 글을 쓰고 노래를 짓고 여행을 하다가 초겨울쯤 참여자와 마지막 인사를 나눌 것이다. 흥하거나 망하는 건 중요치 않다. 인터뷰를 마치기 전에 천윤희 위원은 그들에게 부탁했다. “결국, 문화예술교육은 무엇이라며 자기 정의를 내릴 수 있길 바란다.” 마르지 않고 끝내 강에 다다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처럼 다시 동그랗게 둘러앉아 각자가 찾아낸 한 사람을 떳떳하게 증언하고, 서로 애썼다며 다음을 희망하고, 중매쟁이가 없어도 신나게 떠들고 개운하게 돌아가기를 막연하고도 선명하게 상상한다.
- 이전글✉[아뜨르릉] 온 계절 모두 다 다른 나무가 있었다
- 다음글다음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